Story
15호 [잡동사니 고전인문학]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가 또 있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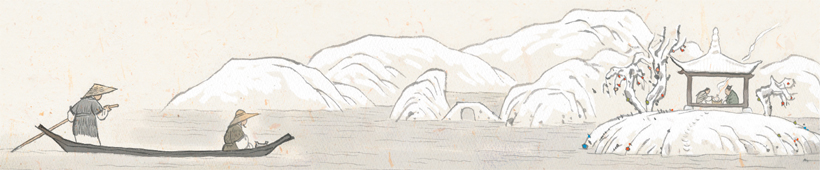
[잡동사니 고전인문학]
당신처럼 어리석은 이가 또 있구려
글 황미숙 ‘문명고전작은도서관’ 지기 그림 김병하
항주를 방문했던 그해 겨울,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 세 개의 달을 보아야 한다며 우리 일행은 서호를 꾸역꾸역 찾아갔다. 장대(張岱, 1597~1680)의 ‘서호십경(西湖十景)’중에서 ‘삼담인월(三潭印月)’을 구경하려고 찾아간 서호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는 꾸물거리고 바람조차 불어 더욱 스산하게 추웠다. 결국 눈이 내렸다. 그곳에 더 머물수 없어서 이내 돌아 나오며 눈 구경이라도 하였으니 다행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을 맞아가며 일행 중에 한 명이 장대의 ‘호심정(湖心亭) 눈 구경’ 이야기를 해주었다.
명나라 말기의 장대는 겨울 서호의 풍광에 대한 감흥을 ‘호심정간설(湖心亭看雪)’에 담고 있다.
숭정 5년 12월에 나는 서호에 있었다. 큰 눈이 사흘이나 퍼부어 호중에는 사람의 발자취도 새소리도 다 사라졌다.
그날 아침에 나는 작은 배를 하나 잡아타고 털옷에 화롯불을 안고 홀로 호심정(湖心亭)의 눈을 보러 갔다.
빙화(氷花)가 하얗게 서려 하늘도, 구름도, 산도, 물도 위아래 모두가 흰색이었다.
호수 위 그림자는 오직 한 줄기 기다란 흔적만 남기고 호심정은 한 점으로 내 배와 같이 겨자씨 같았다.
배 안에는 두 사람인 듯 세 사람인 듯 이미 한 알처럼 보였는데, 정자 위에 오르니 두 사람이 이미 담요를 펼쳐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동자가 술을 데우는데 화로 위의 주전자는 막 끓고 있었다.
나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호수 가운데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단말인가!”
나를 잡아끌어 함께 술을 마셨다.
나는 큰 잔으로 석 잔을 마시고 그들과 헤어졌다.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금릉(金陵)사람으로, 이곳을 방문하였단다.
돌아와 배를 내릴 즈음에, 사공이 중얼거리기를 “당신이 어리석다고 말을 못 하였더니, 당신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어찌하였든 우리는 장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서호의 풍광을 맞이했던 것이라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돌아오면서도 서호에 대해 저마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차안은 훈훈했다. 백거이가 어떠했다느니, 소동파가 어떠했다느니, 항주 미인 서시를 기념하는 의미로 ‘서자호’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일행은 이내 흥취가 올라 그날 밤은 모두 시인이라도 된 듯하였다. 밤새도록 독한 술을 앞에 놓고 서호를 칭송하는 시를 써야 한다느니 한 구절씩 읊어야 한다느니 주거니 받거니 하였다. 다음날의 공식 일정에 대한 관심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리고 말았다.
빡빡한 일정을 밀쳐두고 서호를 찾아갔던 일행들은 지금도 만날 때 마다 그날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꼭 세 개의 달을 보고 와야 한다며 벼르기만 한다. 모두들 현실적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 때 졸지에 한나절의 일탈을 맛본 즐거움은 오래도록 우리들을 힘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벼슬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마다 도연명(365~427)의 〈귀거래사〉의 한 구절을 빗대어 글을 적고 있다. 도연명에게는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향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음주> 20수중에 제19수에서 “지난날 오랜 굶주림에 시달린 끝에, 쟁기 내던지고 벼슬살이 흉내 냈다.”라고 하였다. 애초에 자신이 관직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오랜 굶주림을 견디기 어려워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 어쩌겠는가. 번연히 겪어야할 고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얻은 것이 없다고 여긴 그는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천년을 내려오는 책 두루 펼쳐보며 / 歷覽千載書 때때로 옛 어진 이들을 만난다. / 時時見遺烈
높은 지조를 따를 수는 없겠지만 / 高操非所攀
그런대로 곤궁 속의 굳은 절조는 배웠다. / 謬得固窮節
평진후(平津侯)와 같이 못될 바에야 / 平津苟不由
한가하게 사는 것이 졸렬하다 하겠는가? / 捿遲詎爲拙
한마디 말 밖에다 뜻을 부치지만/ 寄意一言外
이내 마음 누가 분별하리오. / 玆契誰能別
〈계묘년 경원(敬遠)에게 보내는 시〉 - 도연명
그래서 우리는 도연명을 핑계로 가끔씩 꿈 꿀 수 있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곤궁 속의 굳은 절조’라며 꿈만 꾸나보다. 이와 같이 가난한 지식인이 불의의 시대에 처해 이상과 현실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하면서도 끝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천한 그를 추앙하는 것이리라. 어쩌면 그의 뼈 아픈 일상은 못 본 체하며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픈 마음에 그를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원생활에 향한 마음만은 나도 동감이다.
우리나라 순창 남산에는 조선 집현전 학사로 널리 알려진보한재 신숙주(申叔舟, 1417~1475)의 동생 신말주(申末舟, 1429~1503)에 의해 457년(세조 2년)에 세워진 ‘귀래정(歸來亭)’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은 1974년에 다시 세웠다. 조선의 정자를 이야기 할 때 ‘귀래정’을 빼놓을 수 없다. 신말주의 후손인 신경준(申景濬, 1712∼1781) 등이 대대로 뿌리 내리면 살았던 세거지에 오래된 고가는 지금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적송 숲 가운데 자리한 정자는 한여름의 방문임에도 그 서늘함을 자랑하였다.
당시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정하려 할 때, 서거정이 ‘귀래정(歸來亭)’으로 편액하기를 청하고는 ‘귀거래(歸去來)’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귀거래’라는 것은 진(晉)나라의 징사(徵士)도잠(陶潛)이 쓴 말이다. 선배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벼슬을 돌려주고 그 직임을 버리고 그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대개 옛사람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벼슬을 버리고 들어앉기를 제대로 한 이로는 도잠만 한 이가 없다. 후대의 뜻있는 선비라면 누군들 어려서는 배우고 장성해서는 시행하고 늙으면 물러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한번 공명에 그 마음이 오염되고 처자(妻子)에 그 사욕이 얽매여, 돌아가야 하는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 즐비하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산림에 사람이 없다는 비난이 있게 되었다. 아! 비록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참으로 옳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돌아갈 데가 있는데도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가지 않는 자라면 다시 무엇을 논하랴.”라고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돌아갈 수 있으려는가.
고령 신씨 가문의 문집인 ‘영천세승’의 번역을 맡아 함께 공부하며, 귀래정을 방문하고자 하던 차에 마침 스승님 성묘를 핑계로 정자를 찾았던 것이다. 송골하게 쓰인 ‘귀래정’ 현판 아래 마루에 앉아서 문집 번역에 대한 어려움과 공부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무엇 한 가지에 빠져보지 않고서야 어찌 삶을 이야기 하겠는가. 죽는 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없으면서 어찌 한 평생을 살았노라고 하겠는가.

- 항주의 서호를 다시 찾아 가는 날, 장대가 ‘오이인전서(五異人傳序)’에서 제안하는 사람과의 사귐에 대한 조언을 잊지 않으련다. “사람이 벽(癖)이 없으면 사귈 것이 없다(人無癖 不可與交). 깊은 정이 없는 까닭이다(以其無深情也). 사람이 흠[疵]이 없으면 사귈 것이 못 된다(人無疵 不可與交). 참된 기운이 없기 때문이다(以其無眞氣也).” 이라는 것을 말이다.
장대가 권하는 바는 무엔가 한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보여주는 처세의 한 모습이리라. 기실 처세라고도 할 수 없는 모양새이다. 아마도 세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십상일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선택한 것을 감내해야 하리라. 자기자신이 하는 바에 대해 오로지 집중하지 않는다면 성취를 어찌 이룰 수 있을까 싶다. 끊임없는 노력과 정진만이 성취를 얻는 과정에서 버티는 힘이 될 것이다. 지난한 굴곡의 과정이 없는 성취라면 어찌 소중하다고 하겠는가. 아직도 갈 길은 멀고 넘어서야 할 능선이 가파르다고 할지라도 한걸음씩 옮기다 보면 그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 갈 곳이 없더라도 기탄없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서 간 이들의 삶과 생각과 행동에서 내가 가야하는 길의 나침판을 찾는다. 기준을 찾고 뜻을 정하고 소신대로 행동하고자 한다. 매번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들어서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다른 이에게는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며, 기쁜 일이 없어도 스스로의 즐거움은 그만둘 수가 없다.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자 할 뿐이다.
황미숙 수원 교동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영동시장 귀퉁이에서 콩알만한 ‘문명고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한문고전 번역과 글 쓰는 일 그리고 역사·한문고전을 가르치고 있다. 수원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브[기록보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