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 영화 <굿...
수원문화재단
- 사는 게 즐거워, 취향껏 사들인 물건들
수원문화재단
- 가을에는 잠시 빌려온 풍경 속에 앉아
수원문화재단
28호 사는 게 즐거워, 취향껏 사들인 물건들
사고 싶은 것보다 사야 할 것을 고를 때 더 신중해진다. 필요한 물건을 적당히 보고 샀다가 후회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다. 반대로 공들여 들인 물건이 취향에 딱 맞고 생활에 도움까지 될 땐? 행복과 안녕이란 말은 동화 속의 것이 아니다. ‘잘 사는’ 고민이 곧 ‘잘 사는’ 비결이 된다. 글 하나 그림 소근

부드러운 홍차로 입을 헹구면
바닐 블랙티 치약|닥터폴스|12,900원
샴푸, 바디워시, 핸드솝. 욕실의 물건을 성의껏 고른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는 건 향이다. 좋은 향으로 몸을 씻으면 소중히 다뤄지는 기분이 들어 기뻐지니까. 치약에 관심을 가진 건 최근 일이다. 할인 마트에서도 가장 저렴한 치약을 골라 쓰던 내가 큰맘 먹고 닥터폴스로 바꾼 건 S(그는 조향사다)가 적은 리뷰를 읽은 후다. “늦은 밤 자기 전 바닐블랙티로 양치를 하면서 퍼지는 향이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느꼈어요.” 과연 맵거나 알싸한 맛 없이 개운한 치약은 ‘로맨틱’하다고 할 만했다. 게다가 달큰하고 스모키한 향이 B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치약 뚜껑을 열 때마다 쫓아와 세면대를 짚고 킁킁댄다.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코를 들썩이는 고양이의 얼굴을 보며 하는 양치질이라니. 욕실에 행복이 차오른다.

텐트보다 아늑한 아지트는 없지
꽁냥하우스|네꼬모리|25,000원
고양이에게는 ‘방’이 필요하다. 잠깐 옷장을 열어둔 사이에 그 안으로 파고든 B를 보고 아차 싶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숨을 공간이 줄어든 데다 캣타워까지 없어진 것이다. “무심해서 미안해. 당장 사줄게.” 꼬리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어떤 방을 구해줄 것인가였다. 먼저 월세방을 구할 때와 똑같이 B의 조건을 종이에 적었다. 덥지 않을 것, 꽉 끼지 않을 것, 너무 비싸지 않을 것. 사흘을 검색해 찾은 건 방보다 텐트에 가까운 꽁냥하우스. 바람이 통하는 얇은 소재와 꼿꼿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붕이 좋아 골랐다. 늘 붙어 지내다 방을 주면 서운할 줄 알았더니, 밖으로 삐져나온 꼬리를 볼 때마다 뿌듯하다. B에게 내가 어린 시절 꿈꾸던 ‘텐트 아지트’를 선물한 기분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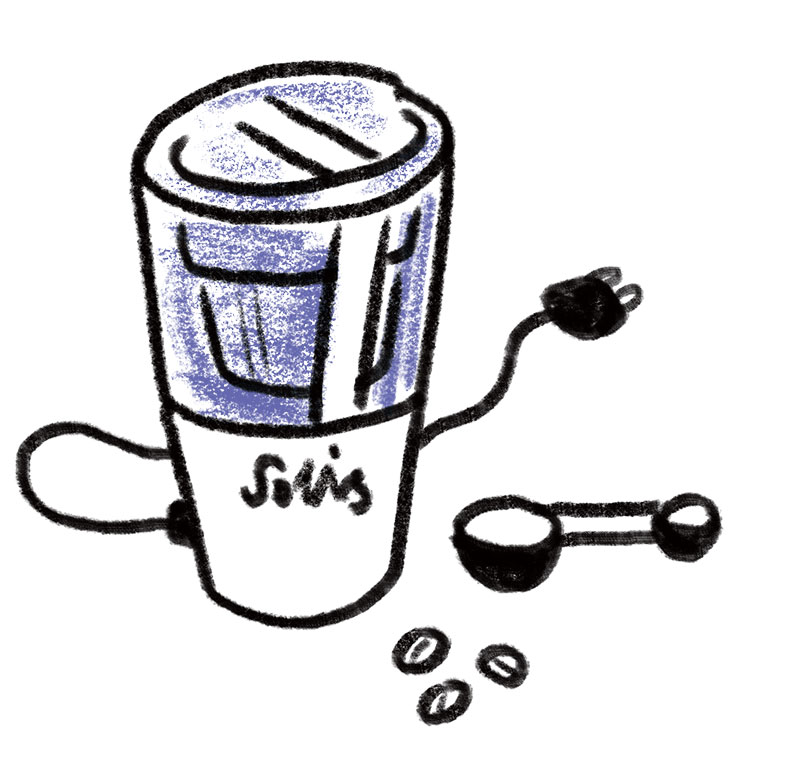
고소한 소리가 나진 않지만
전동 커피 그라인더|솔리스|49,000원
커피에 관한 글을 쓸 때다. 원두를 종류별로 맛보느라 오랜만에 핸드밀을 돌리다 손목이 시큰해 놀랐다.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할 때 생긴 터널증후군이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통증이 심해졌던 기억이 있어 고민에 빠졌다. 그라인더의 핵심은 원두를 얼마나 일정한 크기로 분쇄하느냐인데, 크기가 작은 전동 그라인더는 핸드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좀더 기다려서(물론 돈이 모이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크고 정밀한 모델을 사고 싶었지만 결국 손목을 위해 소형 그라인더를 주문했다. 그런데 웬걸, 커피 타임이 확 달라졌다. 원두를 안치는 시간이 줄고 콩을 그때그때 가니 커피는 더 향긋하다. 핸드밀의 ‘오도독오도독’ 고소한 소리와는 달라 아쉽지만, 생각보다 시끄럽지도 않다. 뜻밖의 효과를 느낄 때 잦아드는 소비의 쾌감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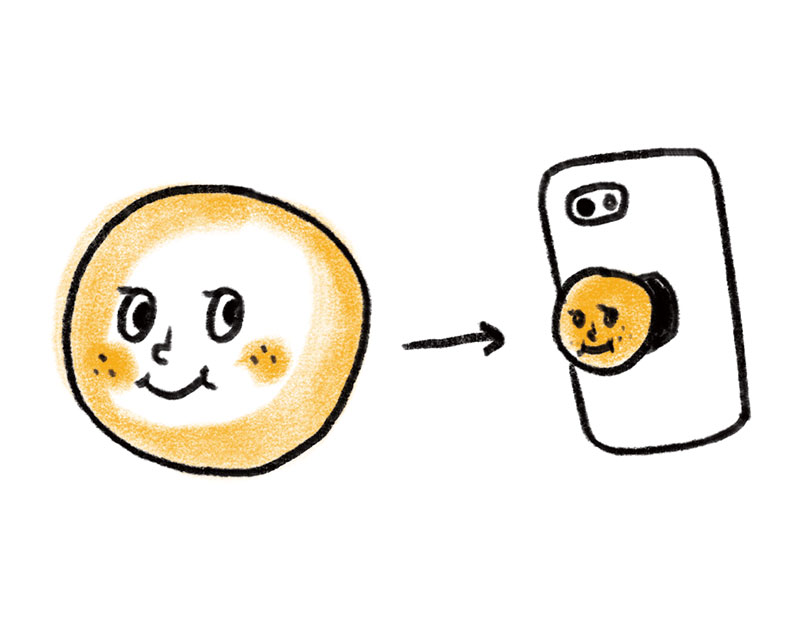
새끼손가락을 쉬게 해줄 얼굴
O,LD! GRIPTOK|오롤리데이|12,000원
뭐든 오른손으로 할 때 익숙하고 믿음직해서 나는 무심코 그쪽을 편애한다.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를 때도 전부 오른쪽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아프면 크게 당황한다. 어느 날은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지끈거려 손을 내려다보고 놀랐다. 전보다 무거워진 핸드폰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져,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밑을 받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다행히 사이즈가 큰 핸드폰이 늘면서 손가락 건강을 챙기는 아이템도 생겨났다. 톡 당겨서 손가락에 걸치거나 핸드폰 거치대로 쓰는 그립톡이다. 그렇지만 핸드폰 뒷면에 붙여 쓰는 만큼 디자인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뭔가를 붙인다면, 주근깨가 핀 오롤리데이의 스마일만큼 귀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름을 읽을 수 없는 차의 맛
천연펄프 티백주머니|에라토|5,000원
차를 받았다. 집에 와 설레는 마음으로 틴 케이스를 여니 둥글게 말린 녹색 잎이 가득 있었다. 단숨에 아쉬워졌다. 잎차를 우릴 인퓨저가 없는 것이다. 집에는 온통 커피 기구뿐이다. 차도 커피 못지않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커피는 원두를 갈아가며 손수 내려 마시면서, 찻잎을 떠서 물에 우리고 뜸 들이는 과정은 조금 번거롭다고 느낀다. 예쁘고 세척이 편하며 찻잎 부스러기가 새지 않는 인퓨저를 찾는 데 실패한 탓도 크다. 다만 선물 받은 찻잎에서 나는 푸른 내음은 꼭 맛보고 싶었다. 그때 회사 커피룸에 있는 페이퍼 티백이 생각났다. 입사 이래 열 번도 채 써본 적 없지만, 쓸 때마다 편리하다고 감탄한 소품이다. 택배는 다음 날 도착했고, 차는 옥색으로 우러났다. 촉촉하고 화사한 맛의 차 덕분일까, 넉넉한 티백 덕분일까. 요즘은 종종 집에서 차를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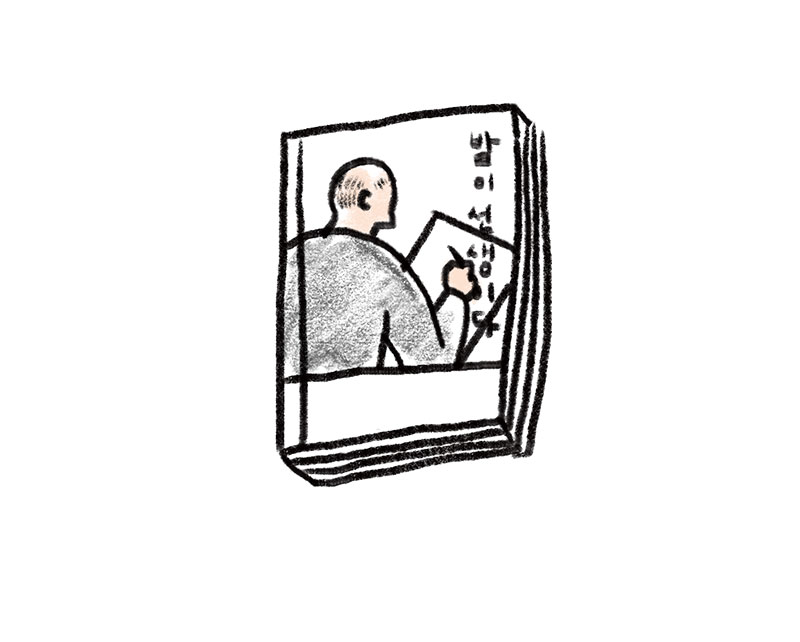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읽는다
《밤이 선생이다》|황현산|난다│13,000원
“씩씩한 소연아.” 그가 남긴 여러 말 중에 내가 읽은 첫 마디다. 지난가을, 나는 생일 선물로 받은 김소연 시인의 시집을 두고 조금 투정했다. 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시집을 선물하니 안 읽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럼 시는 관두고 그 뒤에 실린 황현산 선생의 글을 읽어보란 말에 나는 책을 거꾸로 들었다. 시인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부르는 편지는 떠올릴 때마다 마음을 지그시 누른다. 그의 말이 닿는 곳에 어떤 이름과 글이 있을까 궁금해 시도 읽고 소설도 읽는다. 선생의 1주기.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또 책을 읽는다. 지독하게 더웠던 지난해의 여름을 떠올리며 아주 천천히 그가 남긴 말을 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