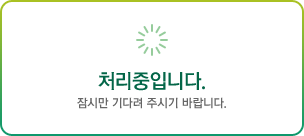홍혜림
(앞) 〈미안한 몸〉, 2022, 철근, 철판, 못, 시멘트, 샤시용 모헤어, 잉크, 코팅제, 비닐, 케이블타이, 철사, 바퀴, 가변설치
(뒤) 〈너무 크고, 너무 작은 파사드〉, 2022, 폴리카보네이트 골판, 잉크, 나무합판, 앵글, 체인, 샤시용 패드, 개줄, 가변설치
개인전
2022 <천안제로프로젝트, 너무 큰, 너무 작은 버>, 천안시립미술관, 천안
2021 <가제트 박람회>, 프로젝트 스페이스 파도, 서울
2019 <까마귀와 매를 위한 세레모니>, 공간 형, 서울
2017 <코뿔소를 위한 세레모니>, A2 RAUM, Kunstakademie Münster, 뮌스터, 독일
단체전
2022 <수원문화재야행>, 화성행궁, 수원
2020 <넥스트코드>,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선정 및 수상
2022 올해의 청년작가 선정, 천안시립미술관
2021 서울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2020 청년지원작가 선정, 대전시립미술관
2019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2017 작품 제작 지원, 독일학술교류처, DAAD, 독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얼굴과 몸을 발견하려 한다. 도주나 여행과 같은 몸의 움직임 전에 먼저 벽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바닥으로부터 솟거나 튀어나와야 하는데, 이 자체를 노동과 갈망으로 읽는다. 홍혜림은 사회 구조에서 일상을 구성하는 물질이 어떤 노동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그 역할을 다하거나 실패하는지 관찰하여 몸체를 세우고, 표면에 갈망을 갖고 수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대응한다. 90년대 초반, 다세대 주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던 지방의 건축 현장에서 건축 자재 조각들을 놀잇감으로 접하며 자랐는데, 이것들은 다양한 사물, 이미지와 함께 발견되었다. 현장 노동자들을 모방하여 지반을 만들어 조각들을 모아 쌓고, 인쇄물, 남은 벽지나 장판 따위를 잘라 붙였다. 목격한 현장의 노동에는 순서가 있었고 ‘맞는 방식’과 ‘틀린 방식’이 있었으나, 휴식 환경 또는 날씨, 자재에 따른 기술, 습관이나 그날 기분 등과 같은 이유로 각자의 방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질료와 형태, 노동 사이의 긴장감을 읽었고, 노동 방식에 따른 결과물의 잠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결과물에 따른 실망과 자기반성, 오갈 데 없음과 건강에 해로움을 시작으로, 당위적 생산 노동, 특정 성별 노동, 필요 노동, 실제 노동, 미술적 갈망에 따른 반강제적 노동 등에서 삶을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협업을 통해 다른 이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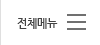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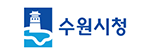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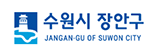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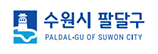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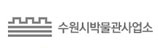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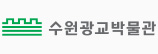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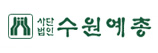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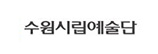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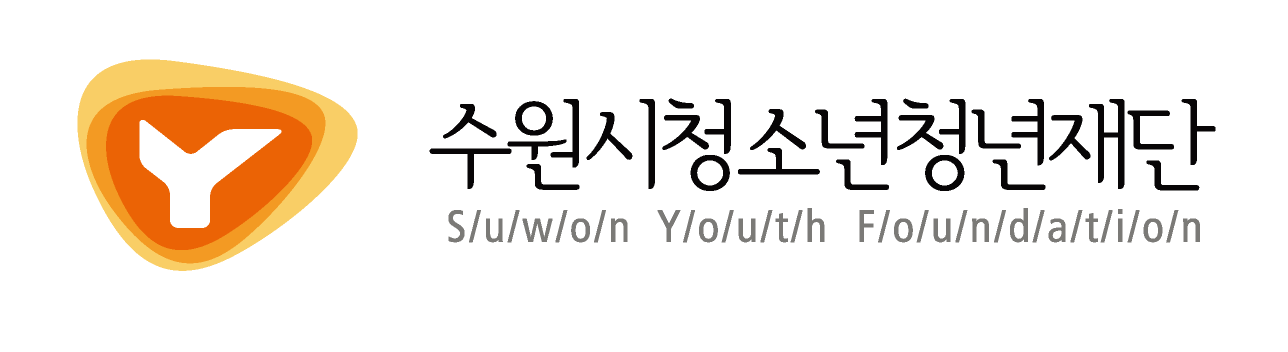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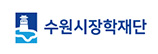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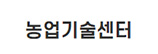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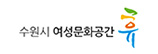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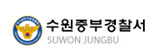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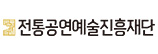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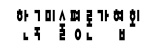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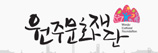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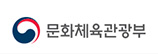

![[재]오산문화재단 로고](/_File/popBanner//imgFile_1471857215_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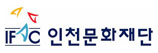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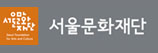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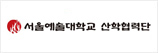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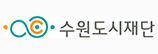











 위로 이동
위로 이동